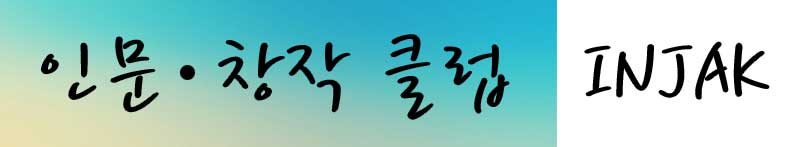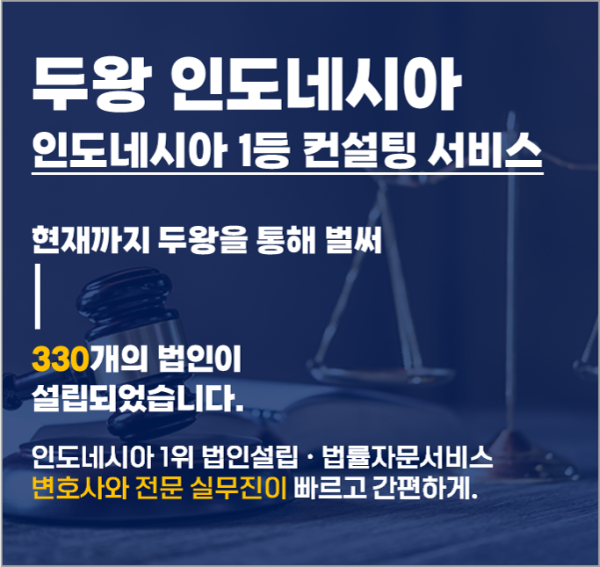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32) 화산과 사랑에 빠진 날, ‘아낙 끄라까따우’
페이지 정보
본문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시아
화산과 사랑에 빠진 날, ‘아낙 끄라까따우’
조 은 아
‘세계 최고의 화산을 뽑는 ‘화산컵(Volcano Cup) 대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끄라까따우(Krakatau, Krakatoa로도 불림)’가 1위를 했다는 뉴스를 접한 지 하루 만에,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친구들로부터 ‘아낙 끄라까따우’에서의 캠핑을 제안 받았다.
아직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심지어 지난해에도 분화를 했던 살아있는 화산에서의 캠핑이라니… 화산컵 대회를 추진한 뉴질랜드의 화산 학자 저나인 크리프너 박사는 화산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교육적 목적’으로 대회를 준비했다는데, 뭐든 배울 게 있으리라. 우리 또한 만 7세와 9세, 두 딸들의 ‘산교육’을 위해 배낭을 챙겼다.
‘끄라까따우’와 ‘아낙 끄라까따우(Anak Krakatau)의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으로부터 135년여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자바 섬과 수마트라 사이 순다 해협의 무인도 끄라까따우 섬에는 뻐르보에와딴(Perboewatan), 다난(Danan), 라까따(Rakata) 등 세 개의 화산이 있었다. 1883년 8월 26일, 저 멀리 호주와 타이완에서도 들릴 만큼의 엄청난 굉음을 내며 끄라까따우의 화산들이 폭발을 시작했다.
당시 자바 섬과 수마트라 사이 순다 해협의 무인도 끄라까따우 섬에는 뻐르보에와딴(Perboewatan), 다난(Danan), 라까따(Rakata) 등 세 개의 화산이 있었다. 1883년 8월 26일, 저 멀리 호주와 타이완에서도 들릴 만큼의 엄청난 굉음을 내며 끄라까따우의 화산들이 폭발을 시작했다.
폭발로 인한 지진과 쓰나미로 당시 인근 공해상의 물 벽이 15m 높이로 치솟았고 쓰나미가 자바섬 메라크 마을을 덮칠 무렵에는 그 높이가 40m에 달했다. 근처를 향해 하던 배 6,500척이 수장되고 해협 양쪽 마을 165개가 폐허가 됐으며 3만 6,000여 명이 순식간에 숨졌다.
끄라까따우의 폭발은 단지, 근처 마을을 폐허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 지상 80 km 너머의 성층권까지 날아간 화산재가 다 떨어질 때까지 10년이 걸리고, 기압파가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고 나서야 사라졌다는, 실감나지 않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 폭발은 참으로 엄청 났다.
폭발은 지구의 역사를 뒤흔들며 사흘 동안 이어졌다.
폭발 이후 전 지구적 저온 현상이 3년 동안 이어졌다. 인근 바타비아(구 자카르타)의 경우 연 평균 기온은 8도나 떨어졌다. 하늘과 태양 빛도 달라졌다. 미세한 암석 파편이 대기 중에 쏟아 부어져 지구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리스 아테네 공대와 아테네 학술원은 2014년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의 그림 ‘승마’(1885년 작)속 하늘이 유난히 붉은 이유도 지구 반대편의 끄라까따우 폭발의 영향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달도 푸르게 물들였다. 대기 중의 먼지 농도가 짙어져 먼지 알갱이들의 노란빛은 흩어져 버리고 파란색을 통과시키면서 끄라까따우 폭발 이후 2년간 파란 달 즉 ‘Blue moon’이 관측됐다.
달도 푸르게 물들였다. 대기 중의 먼지 농도가 짙어져 먼지 알갱이들의 노란빛은 흩어져 버리고 파란색을 통과시키면서 끄라까따우 폭발 이후 2년간 파란 달 즉 ‘Blue moon’이 관측됐다.
사실, 인류 1만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로 알려진 것은 숨바 지역의 탐보라 화산 폭발(1815년 4월)이었다. 하지만 탐보라 폭발과 달리 그로부터 70년 뒤의 끄라까따우의 폭발이 ‘근대 최대 • 최악의 화산 재난’으로 꼽히는 이유는, 지질학적 증거로만 확인되는 ‘탐보라’와는 달리, 당시 통신과 전신의 기술이 앞섰던 지구의 대도시민들이 화산 폭발의 원인과 과정, 여파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포에 떨며 지켜 본 최초의 재난이었던 것이다.
끄라까따우 섬은 그렇게 지구를 뒤흔들고 남쪽 라카타 부분만을 남긴 채 섬의 2/3가 침몰, 250미터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화산이 분화한 지 44년이 지난 1927년 말, 바다 밑에서 잠을 자던 끄라까따우는 마치 새 생명을 키우듯 바닷속에서 부글부글 작은 화산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1929년, 작은 화산 아이 하나를 바다위에 선보인다.
남겨둔 누군가를 애타게 찾듯 ‘아낙 끄라까따우’는 바닷속에 잠겼다, 떠올랐다를 반복하며 계속 용암을 뿜어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분화가 되풀이 되면서 차츰차츰 자라나기 시작한다.
정말 끄라까따우가 바닷속에서 아이를 낳아 키운 것일까? 남겨진 라까따를 향한 그리움일까?
‘아낙 끄라까따우’는 몇 번의 폭발을 거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아낙 끄라까따우 , 갈색 마그마는 2012년 분화로, 검은색은 지난해 분화로 흐른 마그마 >
긴장과 설레임으로 며칠을 보내고, 주말 이른 아침,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짜리타(Carita)로 향했다. 아낙 끄라까따우는 그 지역 마리나(Marina)항구에서 60여Km 거리로, 쾌속정으로 2시간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늘 그렇듯 격한 교통 체증을 겪으며 오후 서너 시가 되어야 우리는 안예르의 한 호텔에 도착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동안 몇 번 와 봤던 곳이지만 그 곳 서쪽 해안 노을 속에 보이는 수평선 너머의 뾰족한 산 하나가 끄라까따우임은 이번 여행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동안 몇 번 와 봤던 곳이지만 그 곳 서쪽 해안 노을 속에 보이는 수평선 너머의 뾰족한 산 하나가 끄라까따우임은 이번 여행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낙 끄라까따우에 가기 전, 남겨진 크라카타우섬의 1/3부분, 지금은 라까따로 불리는 그곳에 먼저 들렀다.
라까따섬은 자바섬 방향으로는 완만한 경사로, 아낙 끄라까따우를 마주보는 북쪽 바닷가는 칼로 뚝 잘라놓은 듯한 절벽을 이루고 있었다. 분화 후 온통 화산재로 뒤덮히고 숯덩이로 변한 나무밖에 없었을 죽음의 섬은 세월이 흐르며 놀랍게 변해 있었다.
바람을 따라 날아온 가벼운 섬유질 식물들, 대나무나 통나무 속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흘러온 개미, 흰개미 같은 곤충들, 새들이 물고 온 열매 그리고 그 씨앗들이 그 메마른 땅을 푸른 숲으로 일궈놓았다.
아래쪽 계곡에는 큰 키 나무들이 골짜기와 산등성이를 뒤덮고 있고, 위쪽으로는 좀 작은 키의 나무들과 야생사탕수수, 줄고사리 같은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 누구의 설명과 기록이 없다면 이 푸르른 숲의 전생을 가늠키는 분명 힘들었을 것이다.
아래쪽 계곡에는 큰 키 나무들이 골짜기와 산등성이를 뒤덮고 있고, 위쪽으로는 좀 작은 키의 나무들과 야생사탕수수, 줄고사리 같은 식물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 누구의 설명과 기록이 없다면 이 푸르른 숲의 전생을 가늠키는 분명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바닷 속도 들여다 보았다. 135년 전 잠들어 버린 그곳의 바다는 너무도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산호들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확 사로 잡아버리곤, 이곳의 어마무시했던 과거를 꽁꽁 숨겨버리고 있었다.
드디어 보트는 아낙 끄라까따우에 닿았다. 해변에 발을 딪고 처음 마주친 것은 커다란 물왕도마뱀이었다. 혀를 내두르며 야영장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 녀석들과 이 해변에서 텐트 야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당황스러움과 함께, 저 거대한 등치가 이 섬까지 어떻게 떠내려왔을까 하는 의문 또한 떨칠 수 없었다. 저 큰 녀석이 이 섬에 올 때 가까운 수마트라에서 호랑이 친구 하나쯤 데려오지 않았기를 바라며.
걱정은 잠시였다.
새까만 화산재 모래와 그로 인해 더 까맣게 보이는 바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딩굴고 바다로 뛰어들고, 또 모래 굴을 파고 또 바다로 뛰어들었다. 화산재 모래 진흙을 천연팩이라며 서로의 얼굴과 몸에 치덕치덕 발라주며 한바탕 물놀이를 마친 후, 우리는 젖은 몸 그대로 아낙 끄라까따우를 오르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막 올라와 민몸뚱이었던 섬은 주변 섬들에서 흘러온 나무 씨앗과 새들의 부지런함 덕인지 라까따섬 때보다 더 빠르게 푸르름을 더해 갔다고 한다.
우리가 머물던 동쪽 바닷가에는 높이가 30미터나 되는 참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고 야생사탕수수도 제법 잘 자라고 있었다.
우리가 머물던 동쪽 바닷가에는 높이가 30미터나 되는 참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고 야생사탕수수도 제법 잘 자라고 있었다.
숲을 지나 시커멓고 거대한 아낙 끄라까따우와 마주했다.
고개가 저절로 번쩍 하늘로 들어올려졌다. 누군가의 흔적도 남을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른 화산재 언덕은 그 가파름이 50도 이상은 되었다. 자칫 몸의 균형을 잃으면 거꾸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뜨거운 심장에서 뿜어내는 열기로 바닥은 아직도 따뜻하고 버석버석한 화산재로 걸음걸음 먼지가 시커멓게 피어 올랐다. 2012년 뿜어져 나왔다는 갈색의 마그마, 그리고 바로 지난해 흘러나온 검은색 마그마가 거친 물결의 형상으로 정상에서 바다까지 이어져 있었다.
고개가 저절로 번쩍 하늘로 들어올려졌다. 누군가의 흔적도 남을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른 화산재 언덕은 그 가파름이 50도 이상은 되었다. 자칫 몸의 균형을 잃으면 거꾸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뜨거운 심장에서 뿜어내는 열기로 바닥은 아직도 따뜻하고 버석버석한 화산재로 걸음걸음 먼지가 시커멓게 피어 올랐다. 2012년 뿜어져 나왔다는 갈색의 마그마, 그리고 바로 지난해 흘러나온 검은색 마그마가 거친 물결의 형상으로 정상에서 바다까지 이어져 있었다.
비록 예전보다 자라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긴 했지만, 813미터의 라까따와 키가 비슷해진 이후에도 계속 자라고 있으니 늦으면 늦을수록 이 가파른 언덕을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가이드의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다.
동쪽 해안에서 올라 우리는 남쪽방향으로 산 중턱을 반 바퀴 정도 도는 코스를 택했다. 남쪽 바다에는 혼자 남은 라까따가 서 있었다.
A long long time ago there was a volcano, Living all alone in the middle of the sea…
누군가 두 화산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보너스 트랙이었던 ‘Lava’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바다 한 가운데 홀로 서 있던 화산 하나. 그는 누군가가 곁에 있길 간절히 바라며 매일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응답하듯 어느 날 그 앞에 새로운 화산 하나가 떠오른다.
마치 라까따가 그 옛날 끄라까따우를 그리며 외로운 바다에서 매일 노래를 불렀고 그에 응답하듯 떠오른 것이 아낙 끄라까따우는 아닌지… 이제는 아이(Anak)가 아니라 연인 (Pencinta)이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함께 노래를 흥얼 거렸다.
마치 라까따가 그 옛날 끄라까따우를 그리며 외로운 바다에서 매일 노래를 불렀고 그에 응답하듯 떠오른 것이 아낙 끄라까따우는 아닌지… 이제는 아이(Anak)가 아니라 연인 (Pencinta)이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함께 노래를 흥얼 거렸다.
정상까지 오를 수는 없었다. 몇 번의 폭발로 정상과 중턱 사이에 커다란 마그마 계곡이 깊게 패였을 뿐 아니라 꼭대기엔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정상 탈환의 꿈은 안 꾸는 것으로 아이들과 훈훈히 마무리 지었다.
평소에는 경비원만이 섬을 지킨다는데 이곳의 밤은 정말 따뜻했다. 보통의 다른 섬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 바람으로 제법 차가운 밤 공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곳은 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산 안으로는 부글부글, 저 머리위로 흰 연기가 폴폴, 땅 아래로는 뜨끈뜨끈한 화산 온천이 흐르고 있으니, 해가 진 이후에도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긴 옷을 둥둥 걷어 올리고 연신 부채를 부치며 땀을 식혀야 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린 뜨끈한 화산 온천수로 샤워를 하고 희미한 발전기 등불 밑에서 저녁밥을 먹고, 해변에서 둘러앉아 모닥불에 마시멜로우를 구우며 아이들은 그 곳에서 행복했다. 그리고 책으로만 접했던 거대한 역사의 흔적 속에서의 하룻밤은 우리에게도 꽤 뿌듯한 밤이었다.

돌아오는 아침, 가이드가 웃으며 “가끔 이곳에도 한국인들이 오긴 하지만 당신들은 여기서 텐트 야영을 하고 가는 첫 번째 한국인 가족”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에 싱글벙글하던 우리 꼬마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I have a dream I hope will come true, That you’ll grow old with me and I’ll grow old with you. We thank the earth, sea, and the sky we thank too. I lava you…
우리는 돌아오는 내내 ‘I lava you’를 흥얼거렸다. 모두가 화산과 사랑에 빠진 날이었다.

*조은아 / 충북 청주 출신
청주 MBC 방송 작가
㈜스포츠 투데이 영화 담당 기자
일본 홈드라마 채널 및 영화 전문 채널 한국 담당 프로듀서
제1회 평화통일문학상 수상
제8회 한 인니 인터넷 문학상 우수상 수상
* 이글은 데일리인도네시아에도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33) 사이자 - 아딘다 (Saidjah -Adinda)의 슬픈 사랑 이야기 18.04.19
- 다음글(31) 찔레곤 안야르 해변에서 18.04.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