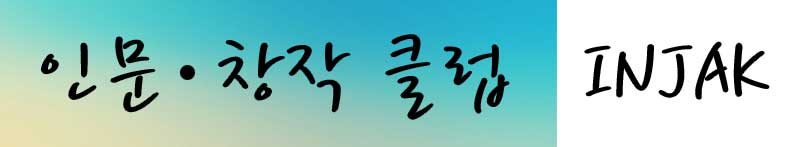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199) 팬데믹, 에피소드
페이지 정보
본문
팬데믹, 에피소드
김현숙
갑자기 아들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저 다음 주에 자카르타로 출장가요”
그래도 난 긴가민가했다. 팬데믹 기간에 벌써 두번이나 미뤄진 출장이었다. 한번은 인도네시아 입국을 사나흘 앞둔 시점에 연기된 일도 있었다. 새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이었다. 늑대소년이 된 그의 말을 믿어야 하나 했다가 3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시작됐다.
출장오면 어디서 무얼 먹이고, 일 끝나고 돌아온 호텔에서 먹을 간식은 뭘 챙겨야 할지, 선물로는 뭘 사서 보내야 하며 상사랑 같이 온다는데 공항에서 먼 발치로라도 얼굴을 봐야하나 말아야 하나?……
출장 일정은 달랑 닷새, 식사는 고사하고 얼굴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안달이 났다. 다행히 5일 중 첫날 저녁시간이 빈다는 말에 너무 반가웠다. 아들이 늘 그리워하던 길거리 음식인 나시고렝, 따후고렝, 그리고 뗌페고렝이 가능한 레스토랑을 알아봤으나 그 세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차라리 그 옛날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서 그때의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하지만 예약하려는 전화기 너머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공허하게 들려왔다. 팬데믹은 사람만 앗아간 게 아니라, 그동안 아끼고 즐기던 것들에도 영원한 격리를 선언해 버렸다. 고심끝에 나시고렝이 맛있을 만한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하고, 나보다 더 들떠보이는 남편과 집을 나섰다. 아들이 묵는 멘뗑의 호텔에서 픽업을 하기로 한 터라 늦을까 노심초사하며 막 출발했을즈음 문자가 왔다. 미팅약속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갑작스레 약속장소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만나는 시간이 조금 늦춰져 살짝 실망스러웠지만 장소는 원래 동선보다 가까워서 좋았다.
누구를 만나기 전 느끼는 이런 설렘이 이 얼마만인가? 20대 초반 가졌던 그 두근거림이 어느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흔들어 대고 있었다. 파르르 수줍은 듯 입술을 떨다 가볍게 몸을 던지던 무수한 벚꽃잎들이, 4월의 그 어느 날처럼 달리는 차창으로 춤추며 날아올랐다.
‘미리 미장원에 들러 머리라도 다듬을 걸 그랬나?’
희끗희끗 모공을 향해 용솟음치는 귀밑 짧은 머리와 이마 끝 잔머리도 눈에 거슬렸다. 이리 늙은 어미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당황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다. 지난 7개월 동안 틈틈이 걸으며 군살이라도 조금 정리해둔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시간은 평소보다 더디 흘렀지만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그리 혼잡하지 않았다. 아들을 만나기까지 한 시간 정도는 근처 한국마트에서 때우기로 했다.
드디어 그 장소에 도착했다. 건물 입구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대각선으로 보이도록 차를 세우고 내릴 채비를 하려는 순간, 남편이
“용재닷!”하고 외쳤다.
그가 가르치는 방향을 보았더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정장차림의 젊은 남자가 건물 입구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키며 전체적인 실루엣이 아들같아 보이진 않았다.
“아닌 것 같은데? 용재는 얼마전 담배를 끊었다고 했는데?……”
남편은 이에
“에구 이 사람아, 담배 끊기가 그리 쉬운줄 알아?”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차에서 내려 확신에 찬 급한 걸음으로 젊은이 쪽으로 향했다. 남편이 가까이 다가가자 마자 그 젊은이는 이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럼 그렇지, 아닐거라고 했지?”
순간 푸웃하고 웃음이 나오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약간은 의기소침해서 차로 돌아온 남편은 “용재니? 했더니 대꾸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 아닌가 봐!”
결국 제 아들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당신이 내 아들 맞습니까?’ 라고 물은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로부터 한 시간은 모르는 문제를 들고 빈칸이라도 채워야 하는 심정과 맞먹도록 지루하기만 했다. 달팽이 마냥 마트의 바닥을 신발로 쓸며 느릿느릿 돌다가, 평소 눈길도 주지 않던 코너에서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마트 안 분식집 앞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현지인들의 살짝 들뜬 모습도 신기한 듯 바라봤다. 한참을 그러다가 차로 돌아오자 카톡이 울렸다.
“미팅 끝났어요. 어디세요?”
이내 어깨가 떡 벌어진 청년 하나가 우리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도 남편은 동작 빠르게 차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가 깊은 포옹을 했다.
그걸 보는 찰나, 그 낯설음은 뭐였을까? 내 머릿속에 선하던 아들의 모습과 그 청년의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마스크 너머로 반짝이는 선한 눈매만 아니었다면, ‘엄마’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목소리만 아니었다면, 난 우리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뻔했다. 키도 전보다 훨씬 커 보이고, 떡 벌어진 어깨와 가슴이 곧 아저씨라 불려도 좋을만큼 풋풋함에서 안정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간 페이스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살이 많이 쪘다든가, 수염이 너무 쑥쑥 자라는 탓에 피부과에서 제모술을 받는다든가 하면서 얼굴은 찬찬히 봐왔지만, 살이 찐 몸매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10키로 이상 쪄버린 그의 달라진 모습이 나를 아프게도 미안하게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곤 했는데, 한번도 챙겨주지 못한 채 걱정만 하고 있던 터였다. 재택근무와 배달음식, 코로나로 닫은 휘트니스 센터, 격리상태로 지내야 하는 모든 상황들이 3년이란 시간동안 아들의 몸에 심각한 타격을 준것이다.
예약했던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그간 밀린 얘기들을 쏟아내며, 서로의 생활에 궁금증을 풀었고, 오미크론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아들도 거기에 휩쓸렸단 얘기도 들었다. 멀리서 너무 걱정스러워 일주일에 서너번은 안부를 물었지만 그때마다, “‘괜찮아요 엄마, 건강하니 염려마세요” 라고 되풀이해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웃기고도 슬픈 가족상봉은 뜻하지 않게 빨리 왔고, 꿈결이었나 싶게 아련히 지나갔다. 하지만 난 또 한차례의 상봉을 계획하고 있다. 싱가폴에서 취업해 비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딸을 만나러 가야하기 때문이다. 아들과의 상봉에서 있었던 웃픈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야심차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딸과도 만 2년이 넘도록 안부만 주고받고 있기에, 딸아이인듯한 이에게 다가가 ‘당신이 내 딸 맞나요?’ 라고 더는 물을 수 없지 않은가!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고 즐기던 것들을 빼앗을 것인지? 왜 그리운 이들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움보다는 가슴부터 먹먹해져야 하는지? 이 황금같은 시간을 얼마나 더 허비하게 만들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모처럼 맑은 저 하늘에 던져본다.
▲일러스트레이션: 최고나
- 이전글(200) 꿈에 대한 이야기 ,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 달러구트 꿈 백화점 22.04.20
- 다음글(198) 춤 추는 소년 22.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