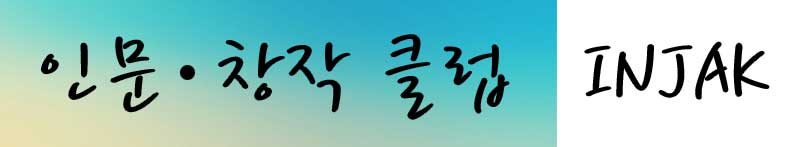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158) 반유왕이의 무인도
페이지 정보
본문
반유왕이의 무인도
채인숙 (시인)
17세기 미국소설에서 보았던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은 소년이
눈을 찡그리며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자잎으로 엉성하게 엮은 오두막 지붕에 햇볕이 총알처럼 들이쳤다
우리는 오두막에서 이십 미터쯤 떨어진 해변에 2인용 텐트를 치고
야생도마뱀을 찍으러 간 혼혈소녀와 감독을 기다렸다
길다란 카메라 스탠드와 조명기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줄담배를 피우는 소녀의 늙은 엄마가 아메리카의 고단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골동품상을 하던 시아버지가 백인 며느리들을 제치고 자신에게 가게를 물려준 것이
몹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는 육지에서 가져온 비스킷 한 봉지를 뜯어 점심으로 먹었다
아잔 소리가 없어도 시간을 맞춰 기도를 마친 소년이 힐끔거리며 앞을 지나쳤다
낮은 파도가 무심하게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다
누군가 소년이 바라보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새우어장이라고 일러주었다
아무려나,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는 것은 그것의 중심을 지키는 일일 거라 여겼다
나는 밤이 오면 어느 하늘쯤에서 남십자자리를 볼 수 있는지 물으려다 그만두었다
이 세상에는 그대로 존재하여 좋은 것이 있다고
떠들썩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썼던 편지 한 대목을 떠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끝내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식어가는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하고 싶은 말들이 가늠조차 되지 않을 때
그저 묵묵히 걷는 것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었다
우리는 저만치 떨어져 앉아서
어둠이 바다를 지우며 거대한 비밀이 되는 순간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나의 반유왕이 무인도에 찢어진 바지를 입은 소년이 아직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다

(사진=조현영/manzizak)
**시작노트:
어떤 시간의 풍경은, 단지 묘사하는 것으로 시 속에 각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 서술하지 않고 묘사하는 것은 그림의 역할이겠지만, 그림을 본다는 건 결국 묘사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발견하는 일이고 시도 마찬가지일 거라 여겼다. 10여 년 전 야생도마뱀을 촬영하러 들어간 반유왕이의 무인도에서, 무서운 정적 위로 내리쬐던 햇살과 숨을 멈추고 서 있던 해변의 야자나무와 무성필름의 한 장면처럼 모래사장을 오가던 소년이 시 속으로 걸어와 내게 말을 걸 때까지, 오래 풍경으로 담아두었다.
* 이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에 함께 실립니다.
- 이전글(159) 잘 지내냐는 인사에 20.10.07
- 다음글(157) 안 보고 안 먹고 운동 안 할 자유 20.09.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