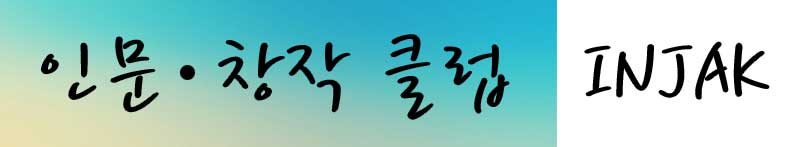인문∙창작 클럽 (92) 코를 막고 만나는 행운의 꽃 ‘라플레시아’
페이지 정보
본문
코를 막고 만나는 행운의 꽃 ‘라플레시아’
조은아
인도네시아의 국화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세 가지 꽃이다.
2003년 4월 1일에야 대통령령으로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나라꽃은 ‘쟈스미늄 삼박(Jasminum sambac)’, ‘팔레놉시스 아마빌리스(Phalaenopsis amabilis)’, ‘라플레시아 아놀디(Rafflesia arnoldii)’ 이다. 쟈스미늄 삼박은 발리와 자바의 문화행사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리가 흔히 보던 백색 쟈스민이고, 팔레놉시스 아마빌리스는 ‘달난초(Moon orchid)’로 불리는 흰색 호접란이다. 마지막 라플레시아는 지구상으로 가장 큰 꽃으로 불리는 희귀꽃으로 2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라플레시아 아놀디’는 지름이 약 1m, 무게가 11kg까지 나가는 단일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다. 1818년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스가 수마트라를 탐험하다 발견했다하여 그의 이름을 따 ‘라플레시아’가 되었다.
개화 시점이 일정하지 않고 9~21개월을 수풀 속에 숨어 살다 꽃을 맺는데 한 달, 꽃봉오리가 벌어지는데 3~4일, 그리고 하루 이틀 활짝 피고 나면 단 하루만에 까맣게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꽃. 그렇기에 꽃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불리는 꽃이다. 잎이 없어서 스스로 광합성을 하지 못해 바닥을 기는 덩굴 식물 등에 기생해 자라며 고약한 냄새로 파리를 불러모으는 꽃이나 아이러니하게도 꽃말이 ‘장대한 미와 순결’인 꽃이 바로 라플레시아다.
라플레시아는 사실, 인도네시아의 국화로 지정되어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10링깃 화폐에 그려져 있고, 코타키나발루에는 라플레시아를 보기 위한 투어 코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등 말레이시아에서 더 유명하다.
주로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에서 자라는 라플레시아는 보고르에도 딱 한 곳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보고르 식물원(Kebun Raya)이다. 끼따스 보유자 기준 15,000루피아를 내면 식물원 입장권과 함께 주는 가이드 맵에 분명 ‘Rafflesia’가 있는 곳이 표시되어 있다. 물론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쉽게 볼 수는 없다. 자주 가는 곳이니 갈 때 마다 식물원 직원들에게 ‘라플레시아’가 어딨냐고 물으면 그들은 한결 같이 말했다.
“Di sana” “Ke situ” 라며 손가락으로 언덕 하나 전체를 가르켰다. ‘저 쪽에 있으나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가 그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곳에 9년 째 살고 있는 나도 딱 한번, 정말 운 좋게 시커멓게 지기 직전의 그 귀한 꽃을 만나봤다. 그날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랜만에 나 혼자 아침 산책을 갔을 때였다. 어디선가 바람을 따라 정말 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라플레시아가 그 주변 어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면 나는 분명 길을 돌아 다른 곳으로 피해 갔을 것이다. 형용할 수 없는, 머리가 아찔한 만큼 고약한 냄새를 맡은 순간, ‘라플레시아’를 떠올렸다니. 두고두고 내 스스로가 기특했다. (운동하겠다며 맨손으로 가는 바람에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질책했다.)
꽃은 산책로에서 약간 벗어난 언덕 중턱에 피어 있었다. 멀리서 보니 수풀 속 땅바닥에 늘어 붙어 있는 거대한 불가사리 같았다. 라플레시아는 수풀 우거진 땅바닥에서 커다란 양배추 모양의 둥그런 꽃봉오리를 맺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까지는 라플레시아를 발견하기 어렵다. 내가 만났던 라플레시아는 벌써 검은 빛이 감도는, 하루 늦게 만났더라면 보지 못했을 상태였다. 붉은색, 갈색, 자줏빛 등이 엉켜져 얼룩덜룩한 무늬의 두껍고 커다란 다섯 개의 꽃잎이 가운데 커다란 항아리 모양의 꽃술 구멍이 있었다. 깊게 파인 홀 안쪽으로 뾰족뾰족한 수술이 솟아나 있고 죽은 파리와 벌레들이 가득했다. 가장 자리가 검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자태가 무언가 오싹함을 풍기고 있었다.
역시 ‘사체 썩는 냄새’라더니, 코를 막았는데도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유일하게 꽃가루를 옮기는 파리를 유인하기 위해 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를 풍긴다고 한다. 라플레시아는 오로지 꽃과 뿌리로만 존재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라플레시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더 필사적으로 악취를 뿜어 매개체인 파리를 유인하는 것이 아닐까. ‘유희왕 카드’나, ‘포켓 몬스터’,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 에서도 라플레시아가 몬스터 캐릭터로 등장하는 등 일본 대중문화에 라플레시아가 자주 등장하기에 나는 어느 정도 귀여움도 갖춘 꽃이 아닐까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꽃’을 보고 이렇게 충격적이고 코를 막고 들여다 보긴 처음이었다. 이렇게 저렇게 꽃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그 냄새에 익숙해 질 무렵 문득, ‘이 냄새가 아니라면 이 꽃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묘한 붉은 빛과 커다랗고 웅장한 잎. 악취만 아니라면 내 정원에 한 송이쯤 피게 하고픈 꽃임은 분명했다. 며칠 동안 악취가 코끝에서 맴돌았다. 붉고 시커먼 꽃잎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사실, 꽃이 꼭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양한 식물들을 알고 있지 않은가. 아마, 라플레시아는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의 결실을 위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찾아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만을 위하여 잠시 피었다 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결실을 맺고 나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예정된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말이다. 그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벌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름답다, 향기롭다’와 ‘못생겼다, 악취가 난다’는 단어의 차이일 뿐. 내가 이 꽃의 형태와 꽃말이 생경하게 느껴졌던 것은 익숙한 단어에 대한 편견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노래 잘하는 한국 뮤지션 ‘국카스텐’도 2010년 발표한 1집에 ‘라플레시아’라는 노래가 라플레시아의 특성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다.
‘끈적한 입을 벌리고 너를 기다릴 때 낯설은 상처는 낡아 버린 날 그리네
비참한 내 입은 다물 줄 모르고 비열한 냄새는 운명을 포장하네’
그 이후로도 나는 식물원을 갈 때마다 라플레시아를 찾아보곤 한다. 그 악취를 잊고 나니, 라플레시아의 유혹적인 자태가 은근 그리웠다. 직원들의 대답은 여전히 “Tidak Tahu di mana” 지만 언젠간 또 만날 수 있으리라 희망으로 말이다.

(사진=구글이미지)
- 이전글(93) 코코넛 나무를 다시 바라보며 19.06.26
- 다음글(91) 캄보자 꽃 19.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