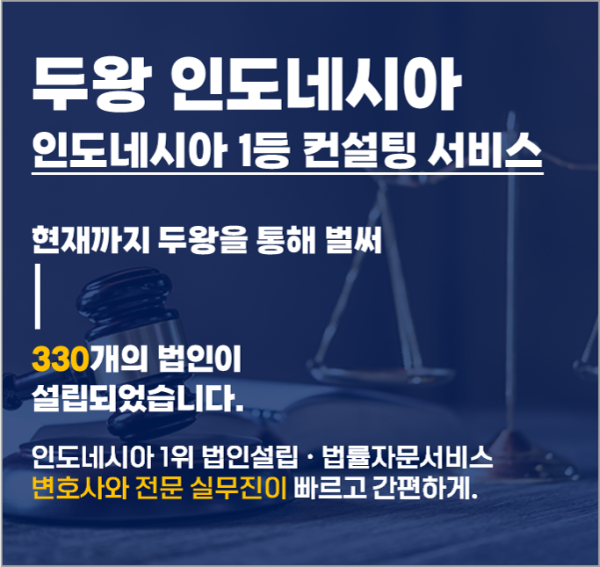한국문인협회 인니 지부 (94) 건망증, 그 당혹스러운 손님 / 서미숙
페이지 정보
본문
<수필산책 94>
건망증, 그 당혹스러운 손님
서미숙 / 수필가, 시인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젊은 시절, 한국을 떠나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망증이 화제가 되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웃을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자년인 새해에 환갑을 맞는 선배도 있었고, 갱년기를 아직도 달고 사는 친구들의 경험도 대략 비슷했다. 그러다 어떤 친구가 어느 영화의 줄거리를 재미있게 이야기 하면서 정작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모인 친구들이 모두 “그 제목이 뭐더라” 하면서 선뜻 대답하는 친구는 없었다. 다들 머리에서 빙빙 맴돌지만 막상 생각해 내려니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다가 ‘에구! 더운 나라에 오래 살아서 그렇지 뭐,.....’ 하면서 바람 빠진 축구공 마냥 모두들 멍한 표정을 짓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로서 두 번째 서른을 맞이하는 나이는 그 연륜이나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렇긴 해도 요즘 부쩍 뭔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그 순간 서글픔과 비애가 느껴지기도 한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치매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좀 겁이 나기도 해서 건망증 증세에 관해 열심히 알아봤더니 연륜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건망증은 그렇다고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호르몬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수긍이 가는 말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적도지방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노인도 안 된 나이에 치매증상이나 다른 합병증으로 가장 수명이 짧았다는 통계도 있다. 나 역시 적도나라에 오래 살아온 까닭에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한다. 건망증이 지나치면 치매와도 관계가 있다지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에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예방책은 평소에 마음을 편안히 하고 여유로운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라 하는데 알면서도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천재도 경험한다는 건망증은 어쩌면 자연의 섭리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건 작은 수박만한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면 그것도 좀 무리가 될 것 같다. 슬펐던 기억, 마음 아팠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들을 모조리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평온한 마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 가지 소망을 가져본다면 살아온 과정에서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싶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바람이고 건강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연찮게 건망증 덕을 보고 웃은 적이 있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웃으로부터 썩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지인 여성이 있다. 상류층의 삶을 누리는 그녀는 이국적인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고집과 주장이 강해 아파트 관리인들과 큰 소리로 싸우기 일쑤고, 거친 언어도 쉽게 사용했다. 얼마 전에도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공원입구에서 이웃과 언쟁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자기 의견을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는 모양인데 안 보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광경이었다. 그 후론 왠지 더욱 그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내 속을 모르는 그녀는 나를 만나면 한국인 친구라고 유난히 반가워하고 반색을 하지만 나는 따라 웃을 수도 없고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에 바빴다. 한번은 저만치서 그녀가 걸어오기에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
몇 번을 그렇게 피했으나 썩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슈퍼에서 그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깜빡 잊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말았다. 다 웃고 보니 그녀였다. “아뿔싸” 주워 담을 수 없는 웃음이 되고 말았다. 그녀가 다가와 내 손을 덥석 잡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라도 내가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슬쩍 피해 다닌 것을 따지고 든다면 나로서는 적절히 할 말이 없는 입장인데 내 우려와는 달리 그녀는 나의 안부를 물으며 진심으로 좋아했다. 얼른 헤어져 집으로 오면서 어찌됐든 이제는 그녀를 보고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갈 일은 없겠구나 싶어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때의 건망증은 그 후로 내 마음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까.
언젠가 철학을 하는 지인이 내 손금을 보면서 사람을 가려 사귀는 정갈한 성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뭐 신통한 풀이인가 흘려들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뭐, 정치가라면 모를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의 친교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건망증 덕을 본 후론 가끔 한 줄의 격언을 읽듯 내 손금을 들여다본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양면성을 지닌 풀이라는 생각이 든다. 손금을 봐준 이는 복채를 받는 이도 아니고 가깝게 지내는 지인인데 폭넓게 마음을 열고 살라고 내게 그런 말을 해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일이다. 본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행여나 불편을 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이해의 대상이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어느 성인의 말씀이 생각나 새삼 깨우침을 얻는다. 꽃이 저마다 다르듯 사람 사는 일도 그러려니 여기면 될 것이다. 상대가 싫으면 피해가야 했던 내 성격과 그에 따른 건망증은 약방의 감초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김광석의 노랫말처럼 서른 즈음도 아니고 서른을 두 번이나 맞이하는 나이에 무슨 기밀을 담당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할 일이 아니라면 적당히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옛날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 시대는 부담 없이 잊어주고 잊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미덕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손을 씻으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사를 나눈다. 좋은 하루를 위한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할까.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아들은 “엄마 그러다가 영화 속, 동막골 처녀처럼 꽃도 달겠네. 하면서 웃는다. “어! 그것 참 괜찮은 생각이네” 그렇게 대답하며 나도 아들을 따라 한바탕 웃었다.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동막골 처녀면 어떠랴. 나를 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자연을 닮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늘 바쁘게 기억하고 메모해야 할 일도 많은 현재의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나’ 라는 주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요즘 내 건망증을 되짚어보면 뭔가 누군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다가 신통하게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아차 그렇지’ 하고 생각이 난다. 그럴 때는 잊고 있던 그 사물 이라든가 사람의 이름이 잠깐 산책 나갔다 돌아온 친구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건망증!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다가 누구에게나 마주치게 되는 무심한 존재이고 당혹스러운 손님이다. 그렇더라도 열대나라에 살면서 윤기를 잃을 수 있는 건조한 마음에 단비 같은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이전글(95) ‘내로 남불’에 대하여 /김준규 20.02.27
- 다음글(93) 믿을 신(信)에 대하여 / 김준규 20.0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