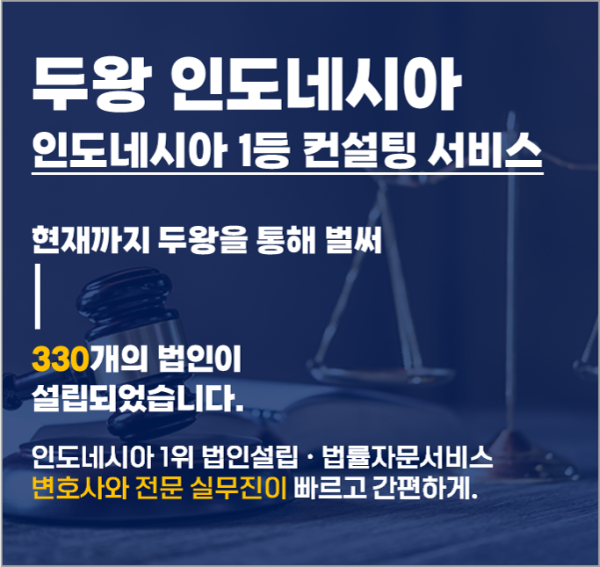정치∙사회 이야기꾼 인생 50년, 사람이 하늘이었다 문화∙스포츠 편집부 2012-12-14 목록
본문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59쪽), 작가의 이야기는 어느덧 오십 해를 떠돌았다. 황석영(69)의 장편 『여울물소리』를 손에 쥐고 읽노라면 일생을 글 감옥에서 보낸 작가의 노고가 전해진다. 스스로 작가인생 50년을 반추하는 작품이라 했듯, 근대화의 파고를 온몸으로 겪어낸 소설 속 주인공은 격변하는 한반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황석영과 여러모로 닮았다.
양반가 서얼인 주인공 이신은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신분의 벽 앞에서 체념하고 이야기꾼으로 변신한다. 전기수(傳奇叟), 글 모르는 민중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전기수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었다. 1인극을 하며 관객을 웃고 울리는 ‘딴따라’였고, 언문 대중화에 기여하는 ‘지식인’이였으며, 여론을 선도하는 ‘정치인’의 면모도 갖고 있었다.
그가 이름을 ‘이신’에서 좀더 대중친화적인 ‘이신통’으로 바꾼 것은 그런 연유였다. ‘전기수 이름은 듣자마자 마빡에 알밤 맞은 드키 딱! 하고 기억나야 되는 법’(163쪽)이라며 신통방통한 새 이름을 받은 신통은 『장끼전』을 읽으면서 진짜 이야기꾼이 된다. 이 장면은 1970년 ‘탑’을 발표하면서 황수영에서 황석영으로 개명한 작가의 인생과 겹쳐진다. 그의 기(氣) 센 이름은 문학을 본업으로 삼겠다는 출사표이기도 했다. 이 바닥에 발을 들인 이상, 신통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간다. 그는 시전에서 연희패·농민·말단 군인들과 어울리며 시대의 아픔을 마주한다. 19세기 말은 ‘세상 어디서나 향청이 썩어서 민고(民庫)는 수령의 판공비를 대는 돈줄’(112쪽)이었던 때였다. 소설의 후반부는 이런 부조리에 대항하며 천지도(동학을 뜻함)에 입도해 혁명에 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석영은 이 소설을 쓰며 줄곧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야기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신통이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선언하는 천지도에 투신한 것은 이야기꾼의 역할을 보다 사회참여 지향적으로 바라 본 것이다. 지배층의 수탈과 불평등에 항거해 진실을 기록하고, 용기 있게 발언하는 게 작가의 운명임을 신통을 통해 피력하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서술방식이다. 화자인 아내 연옥은 집 나간 신통의 뒤를 쫓으며, 곳곳에서 만난 지인들로부터 남편의 행적을 수집한다. 즉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산별적인 에피소드를 퍼즐처럼 늘어놓은 후 하나로 꿰는 방식이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몰입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자칫 영웅으로만 그려질 수도 있는 인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다. 못난 지아비이자 불효자도 신통의 또 다른 모습인 셈이다.
어찌 보면 소설 속 신통은 지인의 증언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그의 독자들이 그를 불러내는 것이다. 화자인 연옥도 남편의 가장 열렬한 독자이지 않았나. 그러니 이야기꾼의 존재는 독자와 함께 완전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할 테다.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신통이 『임경업전』을 읽는 대목이다.
‘임 장군이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게 되자 흥분한 청중들은 간신을 죽여라! 외치며 장 보고 와서 들고 있던 빗자루, 호미, 마른 생선 등속을 내키는 대로 던져서 이신통은 이마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277쪽)
이마의 멍쯤은 영광의 상처로 이고 살겠다는 황석영의 자기고백 같기도 하다.
중앙일보
- 이전글늑대와 함께한 11년, 새롭게 눈뜬 세상 2015.08.20
- 다음글분당서울대병원 – 인니 소에토모병원 MOU 2015.08.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