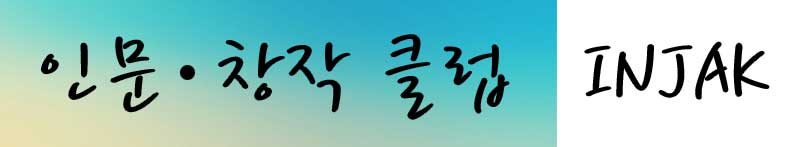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4) 오래된 아침 / 노산여인숙
페이지 정보
인문과 창작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17-09-28 23:04 조회 6,343 댓글 0본문
오래된 아침
채인숙
초록이 아닌 것은 어떤 집의 배경도 되지 않는 섬 나라로 왔습니다.
가져 온 여름 옷 몇 벌을 벽에 걸어놓고, 걷는 사람보다 서 있는 나무가 더 많은 길을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걷습니다.
해가 뜨기 전 기도를 끝내고 다시 날이 저물기 전에는 윗옷을 걸치지 않는 남자들이 집 앞에 몰려앉아 체스를 둡니다
눈이 내리는 풍경을 한번도 보지 못한 여자들은 푸른 히잡을 쓴 채 나무 아래 좌판을 펼칩니다.
밤새 우린 약초 물을 담은 긴 부리 병을 바구니 가득 세워놓고 지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칩니다
동네 공동묘지에는 새벽에 놓아둔 꽃다발이 해가 뜨기도 전에 시들 준비부터 하는데 여자들의 미소는 하루종일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혼자 걷는 아침이라도 떠나온 나라를 그리워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지천으로 떨어진 열대 꽃을 주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오랜 이름들이 하나둘씩 잊혀갑니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은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육천오백 번의 아침이 나를 달래며 지나갑니다
(2016년 스토리문학 가을호 발표작)
노산여인숙
채인숙
파도 끄트머리에 이는 흰 물살같은 감침질. 나일론 이불을 눙쳐 기운 헐거운 낮잠. 플라스틱 잔에 소주를 나눠 마시던 사내들이 바다를 앞에 두고 몇 마디 농을 지껄이다 골목으로 들어선다. 이마 가운데가 겨울 빈 마당처럼 서늘하다. 건너편 공원으로 오르는 긴 계단을 종일 바라보는 늙은 시인은 아직 제 이름이 적힌 시집을 갖지 못했다. 밤마다 훔쳐 온 시를 옮겨 적을 뿐이다. 그가 훔친 시를 곁눈질로 읽는다. 파도가 창문을 들이쳐도 마음 얹힐 일은 아니라는 듯 대문은 낡아가고 담장은 무너진다.
낮잠 속의 꿈이 밤까지 서럽다. 단 한번도 나를 궁금해 하지 않는 너를 견디느라 한 계절이 지났다.
(2017년 시인정신 여름호 발표작)
***시작메모
‘풍경’에 관한 시 두 편을 싣는다. 한국의 문예지에 발표했던 시 중에서 골랐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의 어느 길목 풍경과 어릴 적 살았던 소도시 항구의 풍경을 떠올리며 쓴 시들이다. 우리는 늘 어떤 풍경 속에서 살아 간다. 나를 둘러 싼 모든 풍경들 속에, 나를 만들었고 또 내가 만들어 나갈 이야기들이 있다고 믿는다.
<인작>에는 내게 행복하고 지적인 풍경을 선물해 준 고마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들과 읽었던 글, 함께 낭송하고 귀 기울여 들었던 많은 창작물, 자유롭고 열정적이었던 토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들…… 우리는 지금도 서로에게 따뜻한 풍경을 만드는 중이다.
나는 매주 훌륭한 시인들의 시를 읽고 감상문을 쓰는 신문 연재를 한다. 그리고 게으르고 부족하지만 쉬지 않고 천천히 나의 시를 써야 한다는 좋은 자극을<인작>에서 얻는다. 그 고마움을 나누고 싶어 부끄러운 졸작을 연재에 보탠다.

(사진 : 조현영 /manzizak)
* 이 글은 '데일리 인도네시아'에도 함께 실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