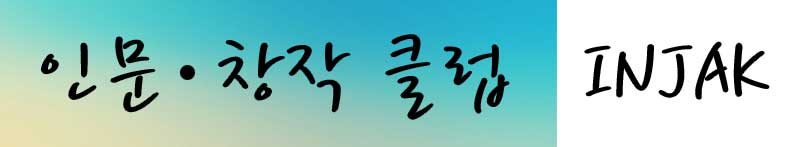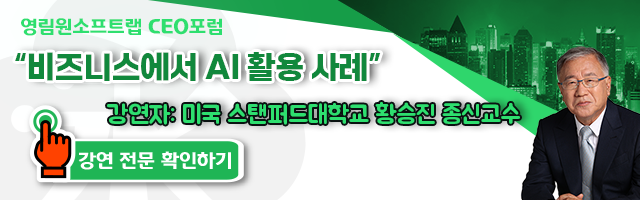(204) 모시 홑이불을 덮고
페이지 정보
인문과 창작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22-07-27 18:59 조회 14,741 댓글 0본문
모시 홑이불을 덮고
홍윤경 / Pleats koko 대표
외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는 정갈함이었다.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래서인지 조금은 까탈스러워 보이는 모습. 할머니가 기성복을 입으신 것을 본 기억이 그다지 없다.
손수 당신의 옷을 많이 지어서 입으셨고, 당신의 딸들에게 그리고 하나뿐인 첫 외손녀인 나에게까지 당신이 손수 바느질한 옷을 지어주셨다. 그 옷의 모양과 섬유의 종류가 간혹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외출복으로만 안 입으면 그만이니까 할머니가 지어 준 옷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손수 재봉틀을 돌려서 또는 손바느질로 지어주신 옷들은 솔직히 잠잘 때 외엔 그다지 나에겐 소용이 없는 그런 종류의 옷들이었다. 이렇더라도 할머니가 지어주신 옷을 마다하지 않고 입은 까닭은 나의 할머니에 대한 애정과 예의였다.
그 할머니의 영향이었을까? 엄마 역시도 내가 어릴 때는 여러 옷들을 지어 입히셨다. 겨울에는 손뜨개질로 손수 떠서 입히시기도 했다. 아버지가 백화점에서 사다 주시는 옷만 좋아하는 딸에게 말이다. 그래도 할머니보다는 모양이나 섬유의 종류가 영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 한 참 커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는 이런저런 옷들을 지어주셨고, 그 옷 역시도 잠옷의 용도 외엔 여전히 그다지 내가 좋아하는 옷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들은 엄마 곁을 떠나 외국으로 떠도는 나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되어주었다. 타향살이가 만만치 않아 서럽던 날들에, 뭔가 알 수 없는 낯선 외국 생활에서 오는 이질감으로 아픈 날들에,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가방을 싸고 싶은 날들에, 가족과, 같은 추억을 공유한 친구가 사무치게 그리운 그런 날들에 그 옷은 위로가 되어주었다.
엄마에게 전화하면 되는데 엄마 목소리에 울음이 터져버릴까 봐 전화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날에 그 옷을 입었다. 외할머니와 엄마가 한 땀 한 땀 지어 준 낡고 이쁘지 않은 모시 고무줄 바지를 입었다. 헐렁한 모시 상의 저고리를 입었다. 지지미 원단의 통 원피스 잠옷을 입었다. 그것은 마치 잠결에 느껴졌던 내 얼굴을 쓰다듬으시던 엄마의 그리고 외할머니의 손길과도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옷을 입은 나는 아주 오래전의 어느 시골 장터의 촌스러운 여자 같아 보였다. 그래도 그 옷을 입고 있음 마음이 한없이 평온했다. 바람 소리에 창문이 흔들거리고, 우루루쾅쾅!!! 천둥번개 소리에 잠을 설쳐야 했던 그런 밤에도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밖의 세상이 덜 무서웠으며
이역만리 몸은 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방 안에서는 엄마의 한없는 보살핌이 할머니의 따스함이 함께하는 것 같이 느껴져 좋았다.
촌스럽기 그지없고, 모양도 맵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누군가 그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본다면 “젊은 아이가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할머니 옷 같잖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들이지만 나에겐 각별하고 애틋한 옷이 몇 벌이 있고, 어느 나라를 가든 챙겨 다녔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다.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10년 전쯤 외할머니가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던 그해 설날에 맞춰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할머니를 만나러 갔다. 그때 할머니는 목욕다녀오시다 넘어지셔서 다리를 수술하셨고, 집으로 퇴원하지 못하시고, 요양원으로 퇴원해서 요양 중이셨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 자꾸만 목욕을 하러 가고 싶다고, 어서 한국으로 나오라 하셨다. 할머니와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셨다.
한국에 있으면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나 목욕을 종종 같이 다니곤 했었다. 요양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목욕 가는 일이 걱정인 할머니였다. 대구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사탕과 음료를 사기 위해 몇 군데의 슈퍼마켓을 뒤졌고 [다른 사탕과 다른 음료는 입에도 안 대신다]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사간 사탕을 환자복 주머니 가득가득 넣어 달라 하셨다. 하나뿐인 외손녀라 특히 귀히 여겨 주셨는데 요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애달팠다.
오랜만에 만나는 손녀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두런두런, 가까이 오라고 하곤 귓속말로 외숙모님들 흉도 살짝살짝 나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두 달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큰 딸이었던 엄마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고, 할머니가 평소 손수 지어 입으셨던 몇 벌의 옷을 챙기셨다. 할머니가 입으셨던 모시 한복을 쓰다듬는 엄마의 손길에 눈물이 묻어났다. 엄마도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엄마가 입으셨던 옷들을 꺼내 만지면서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는 내 엄마의 모습에서 언젠가는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같이 겹쳐 보였다. 울컥하고 뭔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에게 그날 부탁했다.
“엄마와 할머니가 입으셨던 옷으로 내가 오래오래 간직할 뭔가를 만들어 줘”
이 낡고 오래된 모시가 뭐가 좋다고 이런 것들로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고? 필요하면 새로운 원단을 떠 오셔서 만들어 주겠다 하셨다.
“아니 다른 원단 말고, 엄마나 할머니가 평소 자주 입고 그랬는데 이젠 안 입게 되고, 못 입게 된 그 모시로 된 것으로 뭔가를 알아서 만들어 줘”
“언젠가 나도 엄마가 내 옆에 없을 때, 엄마 대신 엄마를 그리워할 무언 가가 필요해”
그 말은 정말이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자꾸 포목점을 가자고 하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입 밖에 꺼내고 말았다. 내 말을 들으신 엄마는 할머니가 입으셨던 옷들을 꺼내셨고, 할머니가 엄마를 위해 지어 주셨던 옷들을 꺼내셨고, 엄마 농 안쪽에 늘 자리하는 엄마의 소중한 반짇고리를 꺼내셨다.
외할머니와 엄마의 치마와 저고리들 그리고 상의와 속바지들은 돋보기를 쓰신 엄마의 손에서 조심조심 뜯어져 크기가 각각 다른 조각천들이 되어 갔다. 그리고 이틀 후면 한국을 떠나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딸을 위해 밤새 작은 앉은뱅이 재봉틀을 돌리셨다. 아무 볼품이 없다고,
한 구석 모퉁이에 예쁜 꽃 자수라도 놓아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이런 것을 뭐 하러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밤새 지으신 것을 내게 주셨다.
모시로 지은 조각 밥상보와 모시로 지은 조각 홑이불이었다. 그것을 받아 들고 얼마나 코끝이 찡하던지 하마터면 대성통곡할 뻔했다. 그렇게 가져온 밥상보와 홑이불을 한 5년 정도는 아까운지 모르고 사용했다. 모시라서 잘 빨아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걸 또 할 줄 모르는 이 딸은 너무 소홀히 막 사용했는지 헤어져 가고 낡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내 엄마만 같아 속이 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밥 상보는 액자를 만들어서 보관하기 시작했고,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홑이불은 고이고이 접어 잘 모셔 두었다가 엄마 생각이 간절할 때만 덮고 잔다. 가끔 엄마가 할머니의 모시옷들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신 것처럼 나도 엄마 생각이 간절할 때 그런 날들이 쌓여갈 때 침대에 펼쳐 놓고 쓰다듬는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는 엄마 이젠 정말 누구 봐도 할머니가 되어 얼굴에 주름과 검버섯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내 엄마…. 등은 굽어가고, 걷는 걸음도 느려지신 엄마…. 보는 것 만도 목이 메고 안타깝다. 그런 엄마를 멀리 떠나 하나뿐인 이 딸은 오늘도 이역만리 먼 하늘에서 저 살기 바빠 불효 아닌 불효를 하고 살아간다.
지난달 6월에 3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다. 그동안 코로나로 날마다 변하는 상황에 대처한다고, 벌여 놓은 사업이 뭐라고 엄마를 3년씩이나 만나지 못하고 살았다. 3년 만에 엄마는 더 할머니가 되어있었다. 살이 빠지셔서 더 작고 한 줌 같았다.
짧은 3주간의 한국 일정 가운데서도 일 때문에 바빴고, 그래도 가능하면 엄마와 더 오래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3주는 너무 빨리 가버리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왔다.
엄마 옆에서 자고, 엄마한테 먹고 싶은 것 해 달라고 해서 같이 먹고, 목욕도 같이 가고, 두런두런 늦은 밤까지 수다도 떨고, 그랬어도 또 벌써 그립다. 다시 돌아온 날 밤 쉬 잠들지 못해서 모시 홑이불을 꺼내서 덮었다. 그만 헤어지고 그만 낡아 가기를 바라는데 엄마가 조금은 천천히 정말 조금만 천천히 늙어 가시길 기도한다. 더 건강하길 바라지는 못하고, 지금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좀 더 자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겠다고 다짐한다.
엄마의 사랑을 덮고 난 엄마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오늘 평온한 잠을 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