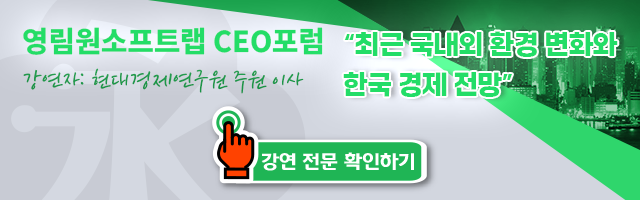(210)시와 나는 서로 끌고 밀며 / 공광규
페이지 정보
수필산책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22-05-13 09:55 조회 16,705 댓글 0본문
< 수필산책 210 > 한국문단 초대수필
시와 나는 서로 끌고 밀며
공광규 / 시인
내가 첫 시집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다. 이정옥의 『가시내』였다. 시골이라 다른 책들도 보기 드물었지만 시집을 보거나 만져보기는 처음이었다. 시집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기억, 그리고 학교를 오고가면서 시를 써보려고 애썼던 추억이 있다. 시의 첫 대상은 고갯마루 산소 앞에 홀로 피어 있는 도라지꽃이었다. 그 시집을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유학 가면서도 가지고 갔었나보다. 시집의 비어있는 부분에 고등학교 때 쓴 글들이 적혀있다. 어느 시는 공책을 찢어서 글씨가 보이지 않게 붙여놓은 것도 있다. 누가 볼까 창피해서 그랬을 것이다. 당시에는 전화도 흔치 않았고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던 시절이어서 이종사촌이 살던 “도봉구 수유동 235번지 7호” 주소도 적혀 있고, “별 깊은 밤이다 안녕히 자자-12시 10분경” 이런 메모도 있다. 자정이 넘도록 사색을 하던 고교생이었던 것 같다. 1977년 9월에 쓴 시 두 개가 적혀있다. 1976년에 입학했으니 고등학교 2학년 때다. 읽어보면 정말 웃음이 나오는 시들이다.
시 쓰는 것을 배워본 적도 문학회에서 활동해본 적도 없이 쓴 글들이다. 그야말로 초보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시는 학교와 기숙사에서 내려다보이는 해운대 바다와 장산에 걸린 달, 넓은 교정에 피어 있던 노란 칸나, 캄캄한 교정에 서 있는 가로등을 동원해서 쓴 시일 것이다. 아무튼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인생의 첫 시다. 해운대역을 지나 송정으로 가는 동해남부선 철길 건너 해운대감리교회에 다닐 때였나 보다. 그 교회에 잘 생긴 중년의 박훈 권사님께 『천로역정』을 빌려 읽은 기억이 난다. 그 책에서 강한 남자는 겸손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배웠다. 일생에 기억나는 독서다. 아무튼 나는 교회학생회 문집 ‘흰 백합’를 만들러 서면로타리 무슨 출판사인가 인쇄소에도 갔던 기억이 난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가끔 방문하는 국립학교여서 그랬을까? 학교에서는 전교생에게 한글날 기념 백일장을 강제로 집행했다. 나는 두 해에 걸쳐 비록 입선과 장려상을 받았지만, 이 작은 상 때문에 평생 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 교내 매점에서는 빵과 학용품과 책을 팔았다. 김형석, 안병욱, 법정스님의 수필들을 사서 읽었었다. 루이제린저의 책도 읽었다. 틀림없이 시집도 읽었을 것이다.
도서실에서는 토마스 하디의 『여자의 일생』을 읽었고, 겨울 방학에는 기숙사에서 옴에 걸린 데다 식중독까지 걸려 설사를 하며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읽은 기억이 난다. 포항체철 장학금을 받은 기념으로 여러 권짜리 『인생론전집』을 사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스땅달 등등을 읽었다. 거기서 『향연』과 고백론, 우정론, 인생론, 사랑론에서부터 플랭클린과 카네기의 처세술까지 읽었다. 그 전집은 지금도 시골집 벽장에 낱권으로 남아있다.
당시 농촌에서는 대부분 대학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 식민지와 6.25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절대 가난 때문이었다. 나는 제철공장에 취직했고, 기숙사 식당 곁에 있는 매점에 드나드는 월부책장사에게 책을 사들였다. 사서오경, 세계문학전집, 세계사상전집, 한국사상전집 이런 것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시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았나보다. 회사 사보에 발표되는 다른 사람의 시를 부러워하고, 이름을 바꾸어 투고해서 발표되기도 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회사 내에서 문학을 한다는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시를 등 너머로 배웠다. 그러다 공장 생활에 회의가 왔다. 공장은 첫째가 위험해서 싫었다. 평생 무얼 해서 먹고 사나 고민을 하다 대학에 진학을 했다. 공장에서 벗어나려고 전공을 확 바꾸었다. 소극적 취미에 불과했던 문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겨우 문학뿐이 붙잡을 게 없었다. 입학을 했으나 생업을 해야 하니 휴학을 거듭하고, 휴학 중에 등단하고 졸업 전에 시집을 내었으나 눈이 높아 취직이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도 등단은 해서 글 쓰는 재주는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일해 보는 게 어떠냐는 몇 분들의 추천도 있었다.
글과 관련된 직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시 덕분이었다. 그러나 해고라는 사건을 겪어, 송사를 2년 8개월간 했으니 막막한 시절도 있었다. 시 때문에 해고가 되었지만, 돌아보니 이런 막막한 시절에도 내가 등단하고 시집을 낸 시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거리가 생겼다. 이분저분의 소개로 여기저기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다. 해고가 되어 먹고 살기 바쁜 기간은 시집을 한참 못낸 것 같다. 생계에 바쁘면 글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 시인이 가난에 시달리는 걸 반대한다. 이 지점에서 대개 시를 포기하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잘 건너왔다. 모임이나 단체에도 나가 사람을 만나고 술을 새벽까지 마시고, 시를 쓰고 시집도 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 돌이켜 보면 청소년기 우연히 만난 시집 한 권과 시에 대한 작은 관심과 취미가 인생을 바꾸는데 여러 계기가 되었다. 시는 나를 위험한 공장에서 탈출시켜 대학으로 끌고 갔다. 시는 내게 독재자를 풍자하게 하는 용기를 주었고, 시는 나를 직장에서 해고시켰으며, 시는 나를 다른 직장에 가도록 길잡이가 되고 명함이 되어주었다.
시는 생업현장 곳곳에서 만나는 조직적 폭력이나 비굴함으로부터 견디게 했으며, 사회적 차별과 서운한 마음으로부터 의연하게 했다. 시는 인생을 한 곳에 몰입하게 했고, 그래서 삶을 간편하게 했다. 지금은 시 말고는 다른 관심이 없다. 다른 게 보이지도 않는다. 시와 나는 서로 끌고 밀며 여기까지 같이 왔다. (시마, 2020겨울호)
*공광규/ 시인
1986년 월간 《동서문학》 등단. 시집 『담장을 허물다』 『서사시 금강산』 『서사시 동해』 등과 산문집 『맑은 슬픔』. 윤동주상, 신석정문학상, 녹색문학상 등 수상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