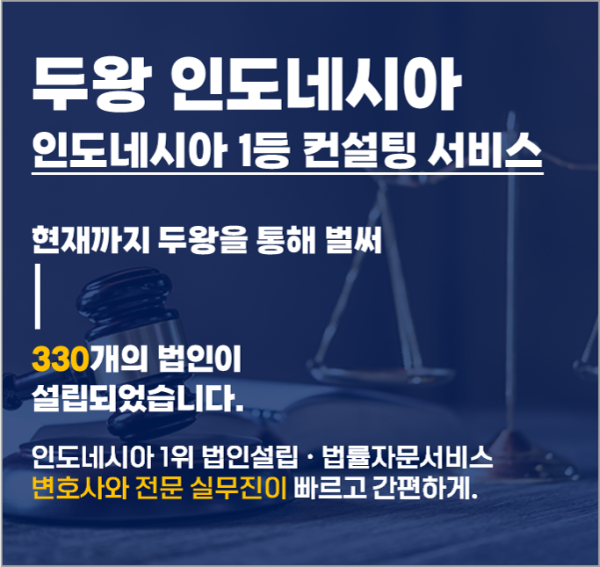(130)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연습 / 강인수
페이지 정보
수필산책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020-10-29 20:27 조회 14,525 댓글 0본문
<수필산책 130>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연습
강인수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한 달 전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큰 이모가 ‘암’이란다. 추석 후에 수술을 할 예정이야, 병 간호를 조카들이 부탁하네. 노인네가 울먹이더라.” 어머니께서는 본인 할 말만 마치시고 툭 전화를 끊으셨다. 연세 79세의 이모는 평생 술 같은 것도 안 드시고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며 매사 서두르지 않는 차분한 성격이었다. 100세도 끄떡없다고 우리끼리 속삭였던 말들이 무색하게 위암이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자매지간에 서로 울먹이며 위로했을 모습을 상상하니 먼 이국 땅 에서도 마음이 찡했다. 물론 지난 주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또 한 번 놀랬다. 현재 이모는 식사도 잘하시고 기력도 좋아지셨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약물 치료도 열심히 받으신다. 가족들은 한시름 놓았다고 한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도 있는 법이다. 준비하는 이별도 있고 갑작스런 이별도 있으며 연습하는 이별도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어른들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입에 달고 사셨던 말 “다리가 너무 아프네. 여기 저기 쑤시네,” 하시며 “좀 주물러봐라.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한웅 큼 빠질까? 어디가 문제가 있나?”라고 하실 때 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른이 되면 저렇게 아픈가 보다. 아프면 빨리 죽을 수 있겠다. 라는 두려움에 싸여 엄마 없는 아이가 되면 어쩌나 라는 걱정에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기분을 맞춰 드렸던 기억이 있다. 하물며 어느 날, 가족끼리 보러 간 영화는 “엄마 없는 하늘 아래”였다. 하늘과 맞닿은 듯 넓게 펼쳐진 하얀 소금밭에서 일하던 아이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고 그 처절한 눈물의 스토리는 온 가족이 눈물에 범벅이 되어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극장 문을 나왔던 기억이 있다. 어쩌면 영화처럼 철없는 동생을 돌보아야 할 언니가 될까 노심초사 했는지 모른다.
보호자의 죽음은 그렇게 내게 공포였고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곧 죽을 거 같다고 여기 저기 아프다고 하시던 어머니는 지금 칠십을 훌쩍 넘기셨다. 오히려 건강하던 주위의 지인들이 퍽 하고 쓰러져 세상과 이별들을 할 때 더 없이 허망했다. 젊은 날, 생활이 바쁘고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만큼 정신없고 철없던 시절, 나는 이상한 생각을 했었다. 사람들의 나이가 살 만큼 살았고 이룰 만큼 이루면 세상과 이별 할 때 후회가 없을 거야! 한 육십? 아니 칠십? 그쯤이면 떠나갈 준비를 서서히 하다가 설령 죽음의 문 앞에 서도 담담해 질 거야, 오십 즈음부터는 노인에 들어가는 길이지, 어떤 재미로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년이면 내가 오십이다. 팔순을 바라보는 이모의 울먹임이 이해가 가고 환갑을 못 넘기고 세상과 작별한 나의 그 분들에게 조금 더 자주 많이 만났어야 할 걸 하는 후회가 겹겹이 밀려온다. 올해는 유독 장례식도 많이 갔고 들려오는 소식도 그러했다. 친구들은 때론 망자에게 섭섭할 말들을 하기도 한다. “고생 안하고 잘 가셨네!” “좋은 때에 가셨네!” 떠난 그 분들은 정말 가신 그날이 좋은 때였을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지만 좀 더 고생하더라도 바람소리, 물소리, 꽃향기를 하루라도 더 느끼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의 삶이 어쩌면 하루하루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연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언젠가 잡았던 손을 놓아야 할 시기가 온다면 아름답게 헤어지기를 바라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십 년 전 우연히 책에서 ‘웰다잉’ 이라는 제목을 읽고 죽음의 방식도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다. 연명치료, 장례문화의 다양성 등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이야깃거리였다. 이제 초 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데 어떻게 삶과 잘 헤어지는 연습을 할 것인가가, 이따금 스치는 생각이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나 장수하는 것은 아니니 품위 있는 삶 뒤에 따라올 ‘웰다잉’의 축복을 누려보고 싶어졌다. 죽음에 앞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돌아오면 아주 어려운 숙제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헤어짐’에 대한 연습이 곧 삶을 잘 살아가는 나에 대한 뒤돌아봄이다. 아주 오래 전 친한 친구가 호스피스 병동에 봉사활동을 다녔다. 친구가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항상 다니던 봉사활동은 빠지는 일이 없이 계속 됐고 같이가자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무섭다는 말로 거절했었다. “우리 나이에 그런데 가면 우울해” 라고 죽음을 터부시 했었다. 그러나 친구는 그곳에서 느끼는 자기반성과 다른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알았다면 나도 그 시기에 함께 해 볼 것을 하는 후회가 살짝 들었다. 우리가 적절한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다가 간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힘든 연명 치료 없이 정말 잘 지내다가 가족과 좋은 관계 속에서 돌봄을 받다가 간다면 그 여건도 얼마나 복 받은 일인가. 내일은 친척들이 수술하신 이모를 위로하러 방문하는 모양이다.
코로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가족임에도 꺼려진다고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 그 또한 너무 슬픈 일이기에 소규모로 찾아뵙는 모양이다. 혹자는 80즈음에 수술이 위험하고 힘들 거라 했지만 거뜬히 이겨내신걸 보면 우리의 100세 시대도 멀지 않음을 짐작해 본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고국은 높고 푸른 하늘로 그윽할 것이다. 그립지만 이 곳 인도네시아도 가을 스럽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 위를 쳐다본다. 이미 저 위에 먼저 간 선배들에게 묻고 싶다. 이 세상에서의 소풍은 어땠는지. 혹시 후회는 없었는지?...라고 말이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